
통증은 없었다. 아니,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몇 달째, 설명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었다. 병원을 찾아가도 엑스레이는 정상이었고, 피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며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겪는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런데 그는 웃을 수 없었다. 마치 바늘이 피부 속을 긁고 지나가는 것 같은 감각, 밤이 되면 더욱 날카로워지는 쑤심, 문득 스치는 통증에 몸이 움찔하는 순간들. 그 모든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도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신경병성 통증’이었다. 근육이나 뼈, 내장 같은 장기에서 오는 통증이 아니라, 신경 자체가 손상되거나 오작동하면서 생기는 통증.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통증의 양상도 기존의 질병과는 전혀 달랐다. 화끈거리고, 저리고, 찌릿하며, 때로는 아무 자극 없이도 갑자기 고통이 몰려왔다. 병명도, 원인도 모른 채, 그는 매일 불편한 몸으로 하루를 견뎠다.
대상포진 이후, 남은 것은 피부가 아니라 신경의 상처였다

신경병성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통증이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도 남는다. 마치 피부 위에 무언가가 계속 덜컥 걸려 있는 것처럼, 혹은 살을 태우는 듯한 통증이 이어진다. 나아졌다고 믿고 지우려 해도, 고통은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 고통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에,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해받기 어려운 고립감도 함께 따라온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흔한 원인 중 하나다. 높은 혈당이 오랜 시간 말초신경을 손상시키며, 손발 저림이나 타는 듯한 감각을 유발한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증상을 그저 혈액순환 문제로 오해하거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긴다는 데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통증은 점점 강도와 범위를 넓혀가고, 결국 걸음걸이나 일상생활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통증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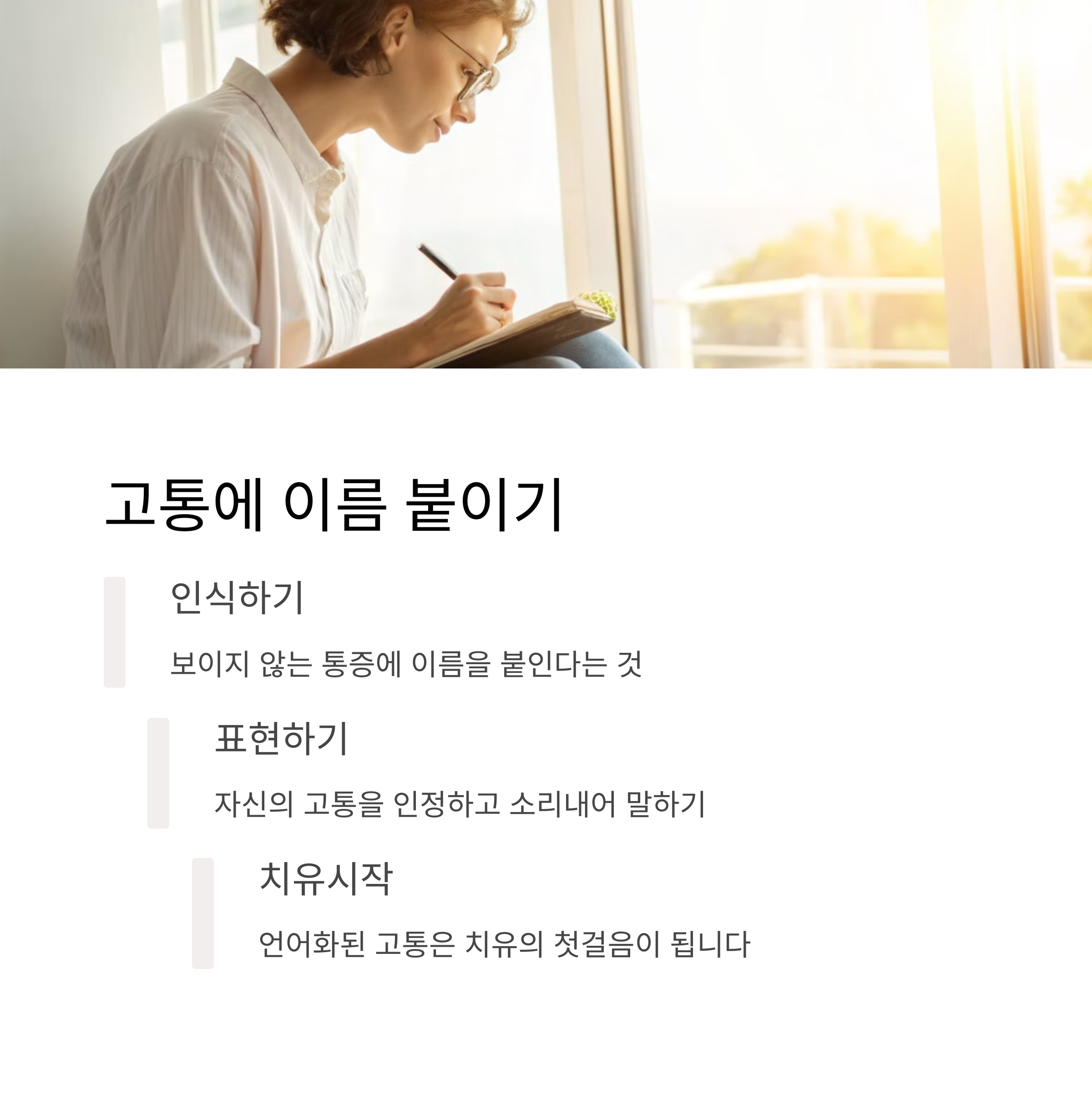
신경병성 통증은 환자의 고통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통증’의 하나로 취급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한다. 통증이 시작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되지 않으면, 통증이 만성화되며 뇌에 ‘고통의 기억’이 각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환자들은 종종 이런 말에 상처받는다. “그 정도로 아픈 거 가지고 왜 그래?”, “그건 마음의 병이야.” 하지만 신경병성 통증은 실제로 존재하는 의학적 질환이다. 통증 경로가 바뀌거나, 통증 신호가 과도하게 증폭되며 정상적인 감각조차 ‘고통’으로 인식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CT나 MRI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환자는 실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약은 통증을 줄이고, 이해는 사람을 살린다

신경병성 통증 치료는 진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 진통제는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거나, 오작동을 막는 데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경련제, 항우울제, 신경전달물질 조절제 등의 약물이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신경차단술이나 고주파 치료 등의 시술이 병행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신경재생을 촉진하는 특수 치료제나 신경성장인자(NGF)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치료가 가능한 한 빨리 시작돼야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이미 ‘통증 회로’가 고착화된 이후에는 치료에 반응하는 속도도 더디고, 완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한 약물 치료 외에도, 통증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심리 상담, 명상, 인지행동치료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고통이 뇌에 남기고 가는 흔적은, 몸의 상처만큼 깊고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 혼자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완치되지 않았다. 가끔 손끝이 저리고, 한밤중에 다리에서 번개처럼 쏘는 통증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고통에 이름을 붙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고통은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제 그는, “그 정도는 다 아파”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다. 누군가 그의 통증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연대감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신경병성 통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의 삶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하루라도 더 빨리 이해받고 치료받을 때 비로소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도 어떤 이는 말하지 못한 고통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누군가의 통증을 ‘보아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로즈힙 추출물, 관절부터 피부까지 천연 항산화의 결정체 (0) | 2025.04.30 |
|---|---|
| 시나린(아티초크 성분), 간과 소화를 함께 지키는 기능성 (1) | 2025.04.27 |
| 식물 유래 세라마이드,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채우는 보습 성분 (0) | 2025.04.25 |
| 손가락 마디가 아픈데 혹시 변형성 지관절증? 정확한 진단 포인트! (0) | 2025.04.10 |
| 거울 속의 그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0) | 2025.03.26 |
| 기억이 흐릿해지는 어느 날, 그리고 놓쳐선 안 되는 조짐 (1) | 2025.03.26 |
| 🍽️ 간편한 영양 대체식 '미베르'의 모든 것 (0) | 2025.03.26 |
| ⚡ 코엔자임Q10,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할까? (0) | 2025.03.08 |




댓글